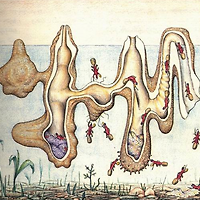오늘(2016. 10. 23.) 친구의 은혜로운 한턱 덕에 안드라스 쉬프의 피아노 독주회를 갈 수 있었다. 바흐 전문가답게 모두 바흐의 곡들로 이뤄진 프로그램.
첫 곡은 이탈리안 협주곡
그 다음엔 프랑스 어쩌고 b minor(모르는 곡)
휴식 후엔 무려 골드베르그 변주곡이었다.
글렌 굴드 이후 바흐 해석의 살아있는 화신이 내한한다 했으나 턱없이 적는 나의 정보력과 경제력은 이러한 대가의 표를 미리 예매해서 볼 깜냥이 전혀 아니었지만 너무나도 운 좋게 친구가 표가 생겨서(!?... 유명한 사람인데 왜 매진이 아니지) 들뜨고 감사한 마음으로 빗속에서 남편의 차에 초보딱지를 달고 미숙한 핸들링을 동원해 난생 처음 자가운전으로 예당으로 달렸다(얼결에 전면주차했는데 어케 나가누... ㅠㅠ).
음악회는 강산이 한번 변할때마다 한번씩 올 법한 많은 일반인(?) 관객 틈에 섞여 앉은 1층 뒤편까지 이탈리아 협주곡의 우렁찬 F장조 화음이 울려퍼지며 시작되었다. 내가 오스트리아에 유학가서 처음으로 피아노 레슨때 배운 곡이라 나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있는 곡이다(작곡전공으로 음대에 가서 피아노 레슨을 받는건 전공필수 과목이긴 하지만 직접적인 공부와의 연관성이 적어서 살짝 취미스러운 활동이 되기 때문에 부담없이 덕질이 가능했다).
한음 한음 모르는 음이 없다보니 연주 타이밍과 템포, 셈여림 등 모든 연주법적인 해석들이 편안하면서도 신선하게 다가왔고, 너무나 맑은 음색에, 정말 별 힘 안들이고도 청중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 연륜이 과히 연애로 치면 선수중에서도 올림피안급이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다. 와~ 저놈 선수네... 말고 그 이상의 그 무엇... 이 뭔지 들리지가 않는다. 특히 내가 잘 모르는 b minor 곡이 연주될 때 그 현상이 뚜렷했는데, 제대로 된 연주였다면 다음 순간이 늘 궁금하고 흥미로워야 하는데 그게 없어서 자꾸만 목에 힘이 빠지고 입이 쩍쩍 벌어지고 눈꺼풀이 무거워지며 눈물이 났다. 옆 아저씨도 쏟아지는 졸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무척 고생하는 눈치였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저 정도 연륜이면 그닥 힘을 안들이고 능숙하게 바흐정도는 껌으로 연주할 수 있으니 힘빼고 영혼없는 연주를 해도 되는건가? 연주자란 게 궁극적으로 무엇인가??
----- intermission -----
골드베르그 변주곡은 마음을 비우고 순수하게 작곡법적인 흥미만을 가지고 들었다. 짧지 않은 테마인데 무려 30여개에 달하는 많은 변주... 성격변주도 아니고 전부 엄격변주에 가까운 마라톤 음놀이를 바흐는 어떻게 지치지 않고 해냈을까...(듣는 사람은 지치는데...)
그걸 생각하니 경이롭고 한음 한음이 저렇게까지 허투루 안쓰인다는게 신기했다. 내년 성신여대 2학년 전공실기에 변주곡 작곡과제가 있으니 그 핑계로 학생들과 현미경 분석에 돌입하고픈 S/M적인 충동이 마구 일었다.
암튼, 연주회로서의 쉬프 독주회는 글쎄... 음반보다는 약간 과감하긴 했지만 그래도 집에서 누워서 듣는거보다 긴장감과 에너지가 과연 라이브에 걸맞게 차이가 충분히 크게 있었나 싶다. 나쁜연주는 분명 아니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훌륭한 연주였다. 그런데 특별한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았다. 저 정도 유명세면 주저없이 기립박수를 치는 관중들을 보니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면서도, 그래도 예술가로서의 양심을 걸고 자신이 부끄럽지 않은 수준으로 최선을 다해 플러스 알파를 제공하는 연주를 했어야 하는거 아닌가 하는생각도 들었다. 저 나이가 되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매너리즘에 안 빠지기가 그렇게 어렵나?
피아니스트 세이모어 번스타인이 50대에 무대 연주법을 통달했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 곧바로 은퇴를 계획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약간은 더 이해가 갈 것 같았다...
첫 곡은 이탈리안 협주곡
그 다음엔 프랑스 어쩌고 b minor(모르는 곡)
휴식 후엔 무려 골드베르그 변주곡이었다.
글렌 굴드 이후 바흐 해석의 살아있는 화신이 내한한다 했으나 턱없이 적는 나의 정보력과 경제력은 이러한 대가의 표를 미리 예매해서 볼 깜냥이 전혀 아니었지만 너무나도 운 좋게 친구가 표가 생겨서(!?... 유명한 사람인데 왜 매진이 아니지) 들뜨고 감사한 마음으로 빗속에서 남편의 차에 초보딱지를 달고 미숙한 핸들링을 동원해 난생 처음 자가운전으로 예당으로 달렸다(얼결에 전면주차했는데 어케 나가누... ㅠㅠ).
음악회는 강산이 한번 변할때마다 한번씩 올 법한 많은 일반인(?) 관객 틈에 섞여 앉은 1층 뒤편까지 이탈리아 협주곡의 우렁찬 F장조 화음이 울려퍼지며 시작되었다. 내가 오스트리아에 유학가서 처음으로 피아노 레슨때 배운 곡이라 나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있는 곡이다(작곡전공으로 음대에 가서 피아노 레슨을 받는건 전공필수 과목이긴 하지만 직접적인 공부와의 연관성이 적어서 살짝 취미스러운 활동이 되기 때문에 부담없이 덕질이 가능했다).
한음 한음 모르는 음이 없다보니 연주 타이밍과 템포, 셈여림 등 모든 연주법적인 해석들이 편안하면서도 신선하게 다가왔고, 너무나 맑은 음색에, 정말 별 힘 안들이고도 청중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 연륜이 과히 연애로 치면 선수중에서도 올림피안급이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다. 와~ 저놈 선수네... 말고 그 이상의 그 무엇... 이 뭔지 들리지가 않는다. 특히 내가 잘 모르는 b minor 곡이 연주될 때 그 현상이 뚜렷했는데, 제대로 된 연주였다면 다음 순간이 늘 궁금하고 흥미로워야 하는데 그게 없어서 자꾸만 목에 힘이 빠지고 입이 쩍쩍 벌어지고 눈꺼풀이 무거워지며 눈물이 났다. 옆 아저씨도 쏟아지는 졸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무척 고생하는 눈치였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저 정도 연륜이면 그닥 힘을 안들이고 능숙하게 바흐정도는 껌으로 연주할 수 있으니 힘빼고 영혼없는 연주를 해도 되는건가? 연주자란 게 궁극적으로 무엇인가??
----- intermission -----
골드베르그 변주곡은 마음을 비우고 순수하게 작곡법적인 흥미만을 가지고 들었다. 짧지 않은 테마인데 무려 30여개에 달하는 많은 변주... 성격변주도 아니고 전부 엄격변주에 가까운 마라톤 음놀이를 바흐는 어떻게 지치지 않고 해냈을까...
그걸 생각하니 경이롭고 한음 한음이 저렇게까지 허투루 안쓰인다는게 신기했다. 내년 성신여대 2학년 전공실기에 변주곡 작곡과제가 있으니 그 핑계로 학생들과 현미경 분석에 돌입하고픈 S/M적인 충동이 마구 일었다.
암튼, 연주회로서의 쉬프 독주회는 글쎄... 음반보다는 약간 과감하긴 했지만 그래도 집에서 누워서 듣는거보다 긴장감과 에너지가 과연 라이브에 걸맞게 차이가 충분히 크게 있었나 싶다. 나쁜연주는 분명 아니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훌륭한 연주였다. 그런데 특별한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았다. 저 정도 유명세면 주저없이 기립박수를 치는 관중들을 보니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면서도, 그래도 예술가로서의 양심을 걸고 자신이 부끄럽지 않은 수준으로 최선을 다해 플러스 알파를 제공하는 연주를 했어야 하는거 아닌가 하는생각도 들었다. 저 나이가 되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매너리즘에 안 빠지기가 그렇게 어렵나?
피아니스트 세이모어 번스타인이 50대에 무대 연주법을 통달했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 곧바로 은퇴를 계획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약간은 더 이해가 갈 것 같았다...
'일상 이야기 > 매스컴과 솔직한 리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현대음악 연주의 새 패러다임을 제시한 project 21AND 의 첫 공연 (0) | 2013.11.25 |
|---|---|
| 이태원에 있는 채식 식당 겸 베이커리 - PLANT (4) | 2013.11.16 |
| 이런 전자음악 발표회 처음이지? 네. 처음이었습니다 (0) | 2013.11.15 |
|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책 - 외계어(?)로 된 코덱스 세라피니아누스(Codex Serafinianus) (6) | 2013.11.14 |
| 갤러리카페 밀(Miiiiil) 박성수 초대전 (0) | 2013.11.09 |
| 기대 이상이었던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2) | 2013.10.20 |
| [서평] 동의보감에서 찾은 몸과 마음의 해답은 멀리 있지 않았다 (1) | 2013.03.14 |
| 영화 <나비와 바다> 리뷰 (8) | 2013.01.28 |
| [서평] 고잉 솔로 싱글턴이 온다 - 혼자 살면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 (10) | 2013.01.24 |
| 리움미술관에서 2프로 부족했던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12) | 2013.01.19 |